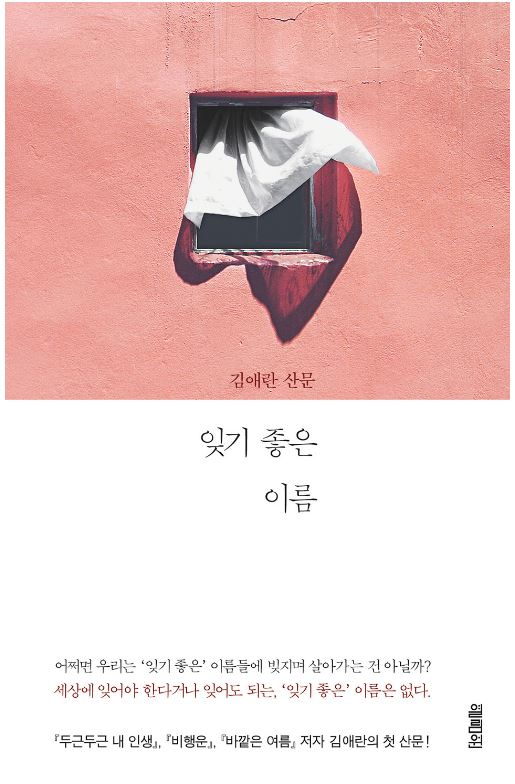
‘맛나당’은 내 어머니가 20년 넘게 손칼국수를 판 가게다. 우리 가족은 그 국숫집에서 8년을 넘게 살았다. 머문 기간에 비해 ‘맛나당’이 내게 큰 의미를 갖는 것은 그곳에서 내 정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때론 교육이나 교양으로 대체 못 하는, 구매도 학습도 불가능한 유년의 정서가. 그 시절, 뭘 특별히 배운다거나 경험한단 의식 없이 그 장소가 내게 주는 것들을 나는 공기처럼 들이마셨다.
나는 우리 삶에 생존만 있는 게 아니라 사치와 허영과 아름다움이 깃드는 게 좋았다. 그렇게 반짝이는 것들을 밟고 건너야만 하는 시절도 있는 법이니까. 어머니는 밥장사를 하면서도 인간이 밥만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기꺼이 아무 의심 없이 딸들에게 책을 사줬다.
어머니는 가방끈이 짧았지만 상대에게 의무와 예의를 다하다 누군가 자기 삶을 함부로 오려 가려 할 때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았고, 내가 가진 여성상에 대한 긍정적 상이랄까 태도를 유산으로 남겨주셨다. 나는 내가 본 게 무언지 모르고 자랐지만 그공간에 벤 공기를 오래 쐬었다.
활자 속에 깃든 잔인함과 어쩔 수 없는 아득함에도 불구하고 ‘말’안에는 늘 이상한 우수움이 서려 있다. 멋지게 차려 입고 걸어가다 휘청거리는 언어의 불완전함 같은 것이.
점이란 게 본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아무래도 나는 이 패가 앞으로 내가 다급하게 해야 할 일을 예고하는 듯해 넋을 잃고 먼산을 본다. 그리고 낯선 대도시에서 자식들을 만날 때마다 시무룩한 얼굴로 ‘이젠 내가 결절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라고 말하는 내 부모에게, 자식들 눈치 보는 일이 많아진 아버지에게, 타고난 자존심만큼 경제력이 따라주지 않아 종종 울적해하고, 험난하게 펼쳐진 인생길 앞에서, 자식들의 호의나 배려 앞에서, ‘나도 다 아는 길이니 혼자 가도 된다’며 화를 내는 어머니에게, 알겠으니 편히 가시라고, 대신 나도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 보겠노라고 약속드리고 싶다.
그러니 만일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린 제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네가 있는 공간을, 그리고 네 앞에 있는 사람을 잘 봐두라고. 조금 더 오래 보고, 조금 더 자세히 봐두라고. 그 풍경은 앞으로 다시 못 볼 풍경이고, 곧 사라질 모습이니 눈과 마음에 잘 담아두라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을 만난대도 복원할 수 없는 당대의 공기와 감촉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철없는 저는 못 알아들을 테고 앞으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러니 20년, 40년 뒤에는 이 시간을 또 어떻게 술회할지 모르겠습니다. 말과 글의 무게가 예전 같지 않은 시대에 각자 선 자리에서 맞이할 고민과 좌절은 또 따로 있겠지요.
결국 우리가 청춘에 대해 말한다는 건 아버지에 대해 말한다는 것과 같은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은 어머니 또는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그리고 그게 한 시절 우리를 그토록 빛나게 한 여름의 속셈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자 새삼 다시 궁금해졌다. 시간은 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 인생은, 삶은 때때로 우리 앞에 어떤 얼굴로 나타나나? 최근 이 책을 다시 펼친 나의 대답은 이렇다. ‘시간은 자전거 앞자리에서 아빠를 돌아보며 웃는 아이의 얼굴’을 하고 있다. ‘앞에서 돌아보는 얼굴과 뒤에서 돌아보는 얼굴 둘 모두’를 닮았다고 말이다. 그게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있는, 말수 적은 문장들을 아끼는 선배가 올봄 내게 준 선물이다.
책도 나이를 먹는다. 나도 나이를 먹었다. 그사이 좋은 일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었다. 김광석 노래를 바꿔 불러보자면 나를 떠난 사람도, 내가 떠나보낸 시간도 있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때론 기쁘게, 때론 무겁게 조우한 문장들이 있었다. 어제는 비가 개서 그런지 날씨가 좋았다. 저녁에 집 앞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를 쐬었다. 순간 나는 ‘내가 아는 공기다’중얼대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내가 아는 저녁, 내가 아는 계절, 내가 아는 바람.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기 전, 늦게까지 밖에서 놀던 날의 날씨. 그러고 보면 시간은 절말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어지고 포개지는 모양이다. 그렇게 돌아오고 어느 때는 나보다 먼저 저 앞에 가 있다 나를 향해 뚜벅뚜벅 자비심 없는 얼굴로 다가오고 때몬 한없이 따뜻한 얼굴로 멀어지기도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읽은 문장 역시 마찬가지일 거다. 더구나 그게 봄을 좋아해, 매년 봄을 아주 열심히 기다리는 작가가 골라준 문장이라면 말해 무엇할까. 집에 와 소매를 걷고 부엌 창을 여니 무언가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게 느껴졌다. 무언가 내 가슴을 선선하고 부드럽게, 유쾌하고 애잔하게 흐트러뜨렸다. 고개 들어 하늘을 보니 조금 전에 활짝 핀 불꽃들이 부드럽게 낙하하고 있었다. 허공에 시간의 테두리를 그리며 빛을 내고 있었다. 그건 다름 아닌 누군가 오래 본 문장, 누군가 오래 볼 문장, 그러니까 여기, 청춘의 문장들이었다.
여름이 끝날 무렵, 나는 그곳에서 ‘당신은 왜 글을 쓰는가’란 질문과 다시 만나보기로 했다. 누군가 우리에게 삶이, 인생이, 역사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데 굳이 왜 그런 수고를 하느냐 묻는다 해도 할 수 없었다.
“저를 가장 절망하게 만든 건,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 앞에서 나는 좀 놀랐다. 그러고 그 ‘놀랐다’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철저히 그녀의 고통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아무리 노력한든ㄹ 세상에는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담긴 타인의 몸이 있다는 걸 알았다. 이자영 씨는 여기서 어떻게 더 노력하라는 건지, 어떻게 더 힘을 내라는 건지 알 수 없어 때때로 절망스러웠다고 했다. 그녀의 대답 속에선 황량한 외로움이 느껴졌다.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의 무관심과 폭력 속에 홀로 버려진 느낌을 받을 때 그 시간에 잠겨본 자만 알 수 있는 외로움이었다.
'회사원의 리뷰 > 도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서 콜센터 상담원, 주운 씨 감상 후기 (1) | 2021.05.13 |
|---|---|
| [도서리뷰] 어른이 되어 그만둔 것 감상 후기 (0) | 2021.04.23 |
| 도서 나대지 마라_슬픔아 감상 후기 (0) | 2021.04.08 |
| 도서 The Having 더 해빙 감상 후기 (0) | 2021.04.07 |
| 도서 밥벌이의 이로움 후기 (0) | 2021.04.06 |




댓글